[서평] 프랑켄슈타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와 작가의 삶이 주는 색다른 해석
처음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놀라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중문화 속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와 원작 소설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프랑켄슈타인은 번개를 맞아 되살아난 좀비 같은 괴물인데,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이 아닌, 그 괴물을 만든 창조주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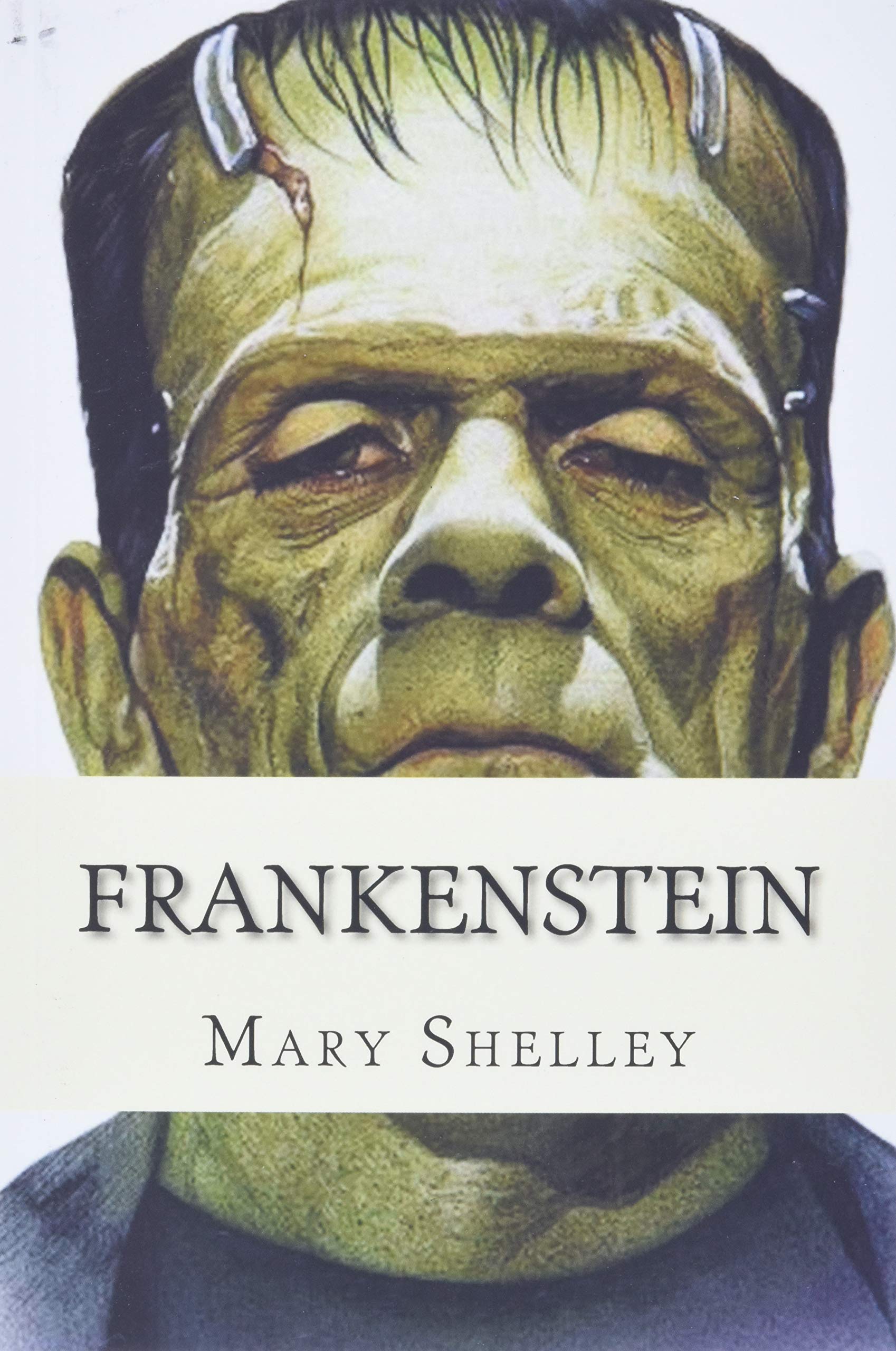
메리 셸리(Mary Shelley)가 쓴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 소설을 넘어 인간 존재, 윤리, 과학의 한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작품이에요. 특히 메리 셸리의 삶과 그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복합적으로 다가옵니다.
작가의 삶과 프랑켄슈타인의 연관성
메리 셸리는 당시 1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급진적인 사상가였던 아버지와 페미니스트 작가였던 어머니 아래서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났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메리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메리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계속 잃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그녀는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명’과 ‘죽음’의 주제를 직접 체감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프랑켄슈타인을 쓴 계기는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그 중심에는 그녀가 겪었던 개인적 고통과 시대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1816년, 메리는 남편 퍼시 셸리와 함께 바이런 경의 별장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써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때 프랑켄슈타인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넘어, 메리 셸리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창조자’의 자리를 탐내는 시대적 흐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이를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프랑켄슈타인
작가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소설은 단순히 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가 만든 생명체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오만함과 책임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메리 셸리는 빅터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설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와 고통을 경고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메리는 단지 괴물의 무서움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괴물을 만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창조주의 비극을 강조했어요.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대중문화 속 프랑켄슈타인과의 차이
이 소설이 처음 출간된 이후,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대중문화에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20세기 영화와 만화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창조주의 이름이 아닌 괴물의 이름으로 알려지며 원작의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가 사라지곤 했죠.
그러나 원작을 읽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면,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욕망과 책임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며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히 괴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메리 셸리의 개인적 삶과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니, 저는 이 소설을 180도 다르게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작품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고전 공포 소설’로 생각하지 말고, 작가가 전달하려 했던 깊은 메시지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